처음엔 누구나 어설퍼.

영국 노팅엄은 런던에서 북쪽으로 기차로 2시간 가량 가야하는
거리에 있는 도시이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있을거 다 있는 시내가 형성되어있고
외곽쪽으로 거주지가 몰려있는 아기자기한 동네라고 할 수 있다.
유학생들이 살아가기에 치안도 좋고 물가도 적당한 편이다.
영국에 도착하고 처음으로 장을 보기 위해
동네 구경을 나섰던 날,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있는
광장을 따라 걸으며 어떤 가게들이 있나 살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로 옷가게, 음식점, 핸드폰 매장,
잡화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생각지도 못하게 런던이 아닌 노팅엄으로 오게 되면서
처음 들어보는 지역 이름에 덜컥 겁을 먹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했지만
걱정과는 달리 생기있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주말엔 혼자서라도 자주 광장에 나가 사람구경을 하곤 했다.
첫날은 길을 잃을까봐 너무 멀리는 가지 않고
말로만 듣던 영국슈퍼마켓 ‘Tesco’에서 간단하게 장을 봤다.
테스코는 영국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슈퍼 중 하나로
가격대가 저렴하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편의점 개념인 곳이다.
영국 마트도 여러 종류가 많은데, 가장 접근성이 좋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첫 장보기 구매 물품들.
정말 당장 필요한 두루마리 휴지, 세제,
그리고 청소에 쓸 물티슈 정도만 구매했다.
처음보는 음식들도 많아서 뭘 사야 하나 한참 망설이다
눈에 들어 온건 오레오 도너츠였다.
‘오레오라면 실패는 없겠지?’라며 집어 들었는데
역시 오레오. 너무 맛있어서 영국음식 맛없다는거
다 과장이었구나~라며 해맑게 반통을 먹었다.
그 뒤에 겪게 될 영국음식의 충격과 공포는 알지 못한 채..
영국과 한국의 물가를 비교하자면 첫번째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외식이나 서브스업쪽이 상당히
비싼편이다. 하지만 런던이 아닌 지방, 특히 노팅엄을
기준으로 하자면 체감 되는 물가는 우리나라 서울과
비슷한 것 같다. 특히 식재료는 비교적 더 저렴한 편이라서
마트에서 일주일치 장을 보아도 50£이내로 충분했었다.
물론 이건 사람에 따라 매우 달라지겠지만!

다음 날, 학교는 1분거리 바로 코 앞이지만
학교 건물을 구경 할 겸 한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하지만 이것도 안일한 생각이었다.
개미굴같이 좁고 꼬불꼬불한 통로로 이어진
학교 건물에서 강의실 찾기 미션이 시작 된 것.
숫자로 호수가 정해 진 것도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너무 많아 강의실을 찾는데 무려 30분이 걸렸다.
너무 정형화 된 한국 건물과 달리 개성있는 영국건물이
예쁘고 좋다고 생각 했는데 내부가 이렇게 말도 안되는
구조일 줄이야.
‘도대체 이 건물은 누가 지은거야?’ 하고 욕이 나올 때쯤
나와 같은 과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길을 묻는 것을
엿듣고 강의실을 찾았다.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과 강의 계획을 듣고
끝! 인줄 알았지만 첫 날 부터 꽤 빡빡한 스케줄이었다.
캠퍼스 탐방과 자기소개 시간 등등
영국대학도 한국처럼 하기 싫은 자기 소개 시키는건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진맥진해 졌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우당탕탕 다사다난하지만
재밌고 나름 순조로웠던 첫 수업이 끝나고,
자기소개 시간에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에게
근처 맛집을 소개 받아 마카로니 파스타를 사들고 집으로 왔다.
전 날에 테스코에서 사 온 망고와 함께 먹었는데
파스타는 날달걀 흰자 맛이 났고, 망고에선 손톱깎이 맛이 났다.
그렇게 개강 첫날은
1.강의실은 전날에 미리 찾아두자
2. 아 이게 영국음식이구나
를 깨닫게 되는 하루였다.

그리고 정신을 미처 차리기도 전에 과제가 쏟아졌다.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에 처음부터 조별로 과제가 시작되었다.
완성작 까지 다같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열댓명 정도의 조원이 한 주제에서 출발 해
아이디어를 발전 시키고 각자의 생각을 공유 한 뒤
개인 작업으로 가는 방식이었다.
영어가 익숙해 지기 전이었던 나에겐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이기도 했지만
부담감이 큰 수업 방식이라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특히나 런던 외의 지방은 발음이나 억양이
조금만 달라도 말을 못알아 듣는 경우가 많아
처음엔 내가 하는 말의 절반도 채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착하디 착한 친구들은 애써 다 이해하는 척을 해 주었지만
소통을 해보면 서로 반만 알아 듣는 것 같은 알쏭달쏭한 느낌.
이 답답함을 아시나요?
그리고 웃픈 에피소드 하나.
한창 옆자리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는거다.
이리보고 저리봐도 다 똑같아 보이는 얼굴들.
영국에도 새내기패션 유행이 있는 건지 다들 비슷한 패션에
비슷한 머리 스타일까지..
넓은 교실에 백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내 옆자리였는지
구분이 안가서 밍기적 거리다 최대한 비슷해 보이는
친구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옆자리 친구 이름이었던
‘아비..?’라고 불러 보았는데 맞은편에 있던
진짜 아비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응..?’
이라며 대답을 했다. 지금 설마 나 부른거니? 하는 표정.
순간 정적이 되고 난 그제서야 내 가방이 놓여져 있는
아비의 옆자리가 눈에 들어 와 머쓱하게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갔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방금까지 얘기 나누던 옆자리
친구 얼굴을 기억 못해? 라는 생각이 드는 말도 안되는
에피소드이지만 외국인들이 동양인들 얼굴을 구분 못하듯이
난 처음에 친구들 얼굴이 너무 헷갈렸었다.
게다가 수업 분위기가 워낙 자유로워 자리 이동도 잦고
정신없이 눈이 마주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느라
여긴 어디? 나는 누구?인 상태였다.
정말 첫 학기 다웠던 경험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당시에 살았던 기숙사 건물 일층의
한인마트가 문을 열지 않았던 때라 한인마트가 근처에
없는 줄 알았던 때다. 한국에서 들고 오거나 택배로 받은
음식들을 위주로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만 먹어도
너무X100 맛있었다. 생활을 하면서 점점 장 보는 스킬도 늘고
요리에 흥미가 생겨 자취력이 수직상승 했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때를 보니 그때 나름데로의 재미가 있었던 것 같다.
생존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느낌이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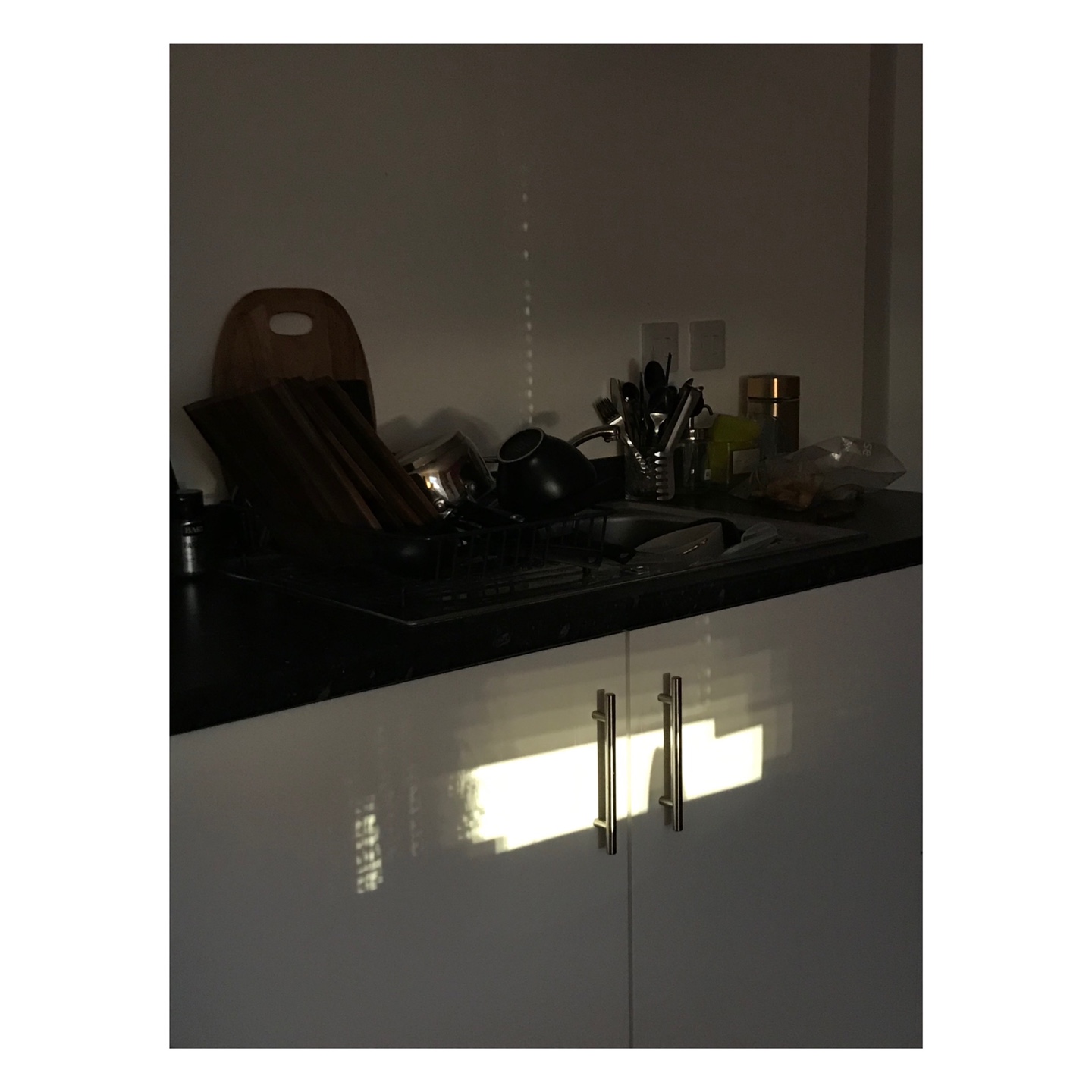
처음 머물렀던 기숙사에선 전에 살던 사람이 두고 간
기본적인 그릇, 수저 정도는 있어서
처음엔 그것들로만 생활을 했었다.
그러다 점점 도마나 큰 냄비, 후라이팬들을
사면서 제대로 된 요리를 해먹기 시작했는데
요리를 하는게 영국 생활에서 가장 큰 낙이자
취미가 되었었다. 놀거리가 많이 없고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는 영국에서 생활을 할 땐
자기만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게 도움이 많이 된다.
차차 영국 마트에서 장보는 방법이나 요리 레시피도
올릴 예정이다!
'영국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디즈니 영어 명언 모음 20선 : 겨울왕국, 모아나, 인사이드아웃 등등 (0) | 2021.06.23 |
|---|---|
| 2021 부산 디자인위크 | 벡스코 디자인위크 ‘후기’ (1) | 2021.06.17 |
| 짧은 영어 명언 모음 20선 | 인생, 동기부여, 자기계발 (2) | 2021.06.15 |
|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 Best 4 | 사이트별 장단점 총정리 (4) | 2021.06.14 |
| 영국 유학 ‘노팅엄’으로 15시간 직항 비행, 디자인과 유학생의 정착기 첫날 (1) | 2021.06.10 |




댓글